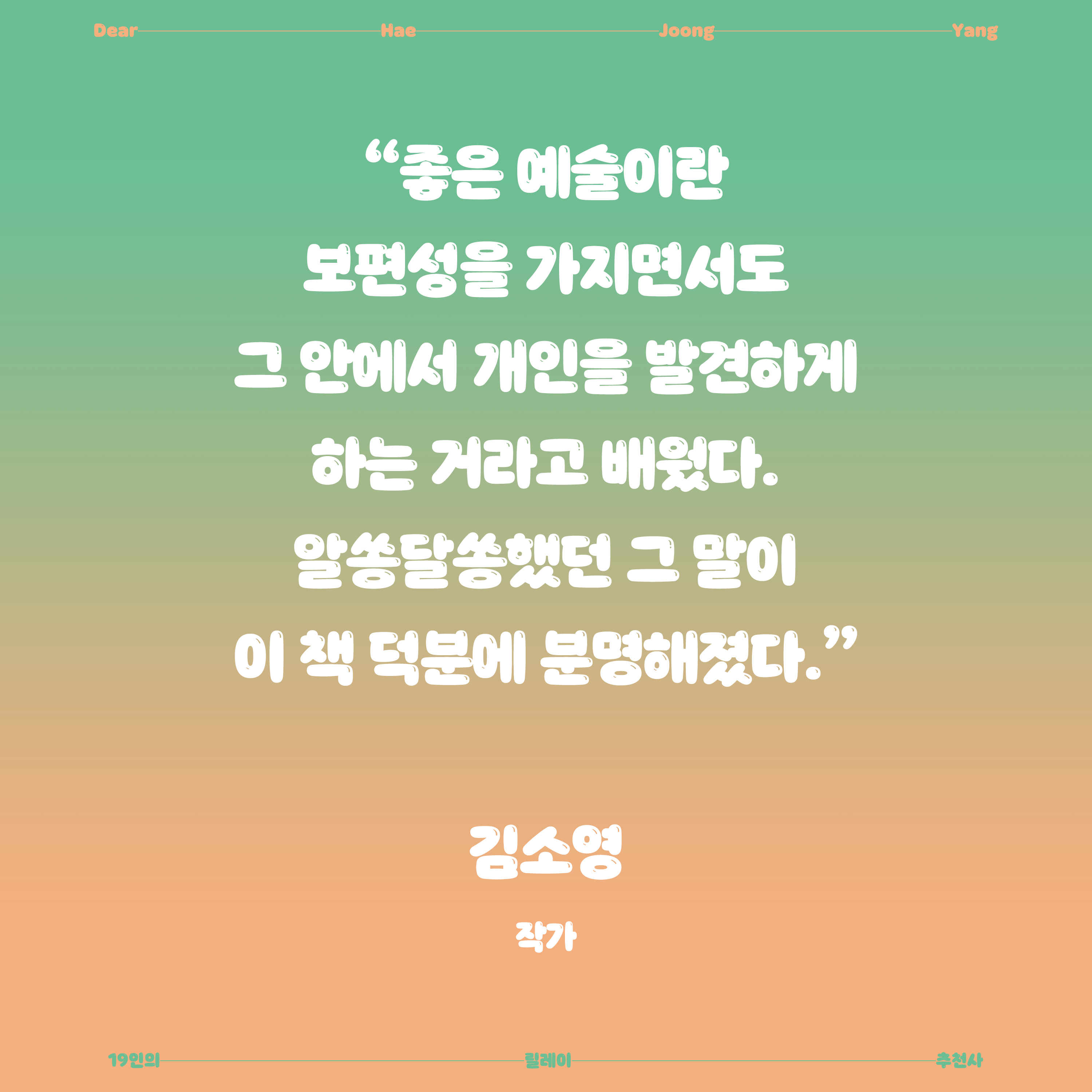
나는 양해중 씨가 어수룩한 사람일까 봐 걱정했다. 이름도 그런 데다 언제나 양해를 구한다고 하고, 첫인상이 조금 고지식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불이익을 당하고 놀림을 받는다. 특히 소설에서 그런 사람은 사회의 부당함이나 인간의 부조리함 같은 것까지 떠안기 때문에 보기가 괴롭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에는 다른 걱정이 들었다. 양해중 씨가 영웅이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다. 무던한 얼굴로 바른 말을 하고 틈틈이 남을 도우며 정의를 실현하고 스스로를 단련해 성장하는 영웅. 그쪽이 더 걱정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현실에 없으니까.
양해중 씨는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현실의 것이면서 다행히도 그럭저럭 해결이 된다. 해결되지 않는 일은 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된다. 이 책을 읽는 건 마치 친구한테 어떤 후일담을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뭐? 그걸 가만 뒀어? 아, 잘했다. 나 아는 사람도 그랬다고 내가 얘기했던가? 그래그래. 그거 너무 웃겨.” 하고 맞장구 치는 것 같다. 읽으면서 계속 내 주변의 양해중 씨들을 떠올렸다. 이 사람도 양해중 같고 그 사람도 양해중 같다. 그러다가 그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혹시... 난가? 내가 양해중인가? 나도 아르바이트할 때 그랬는데. 나도 사실 그런 사람 도와준 적 있는데. 나라도 그럴 것 같아. 와, 나도 말실수 많이 했는데! 난가 봐. 내가 소설에 나오네! 좋은 예술이란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그 안에서 개인을 발견하게 하는 거라고 배웠다. 알쏭달쏭했던 그 말이 이 책 덕분에 분명해졌다. 그런 작품을 만나면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