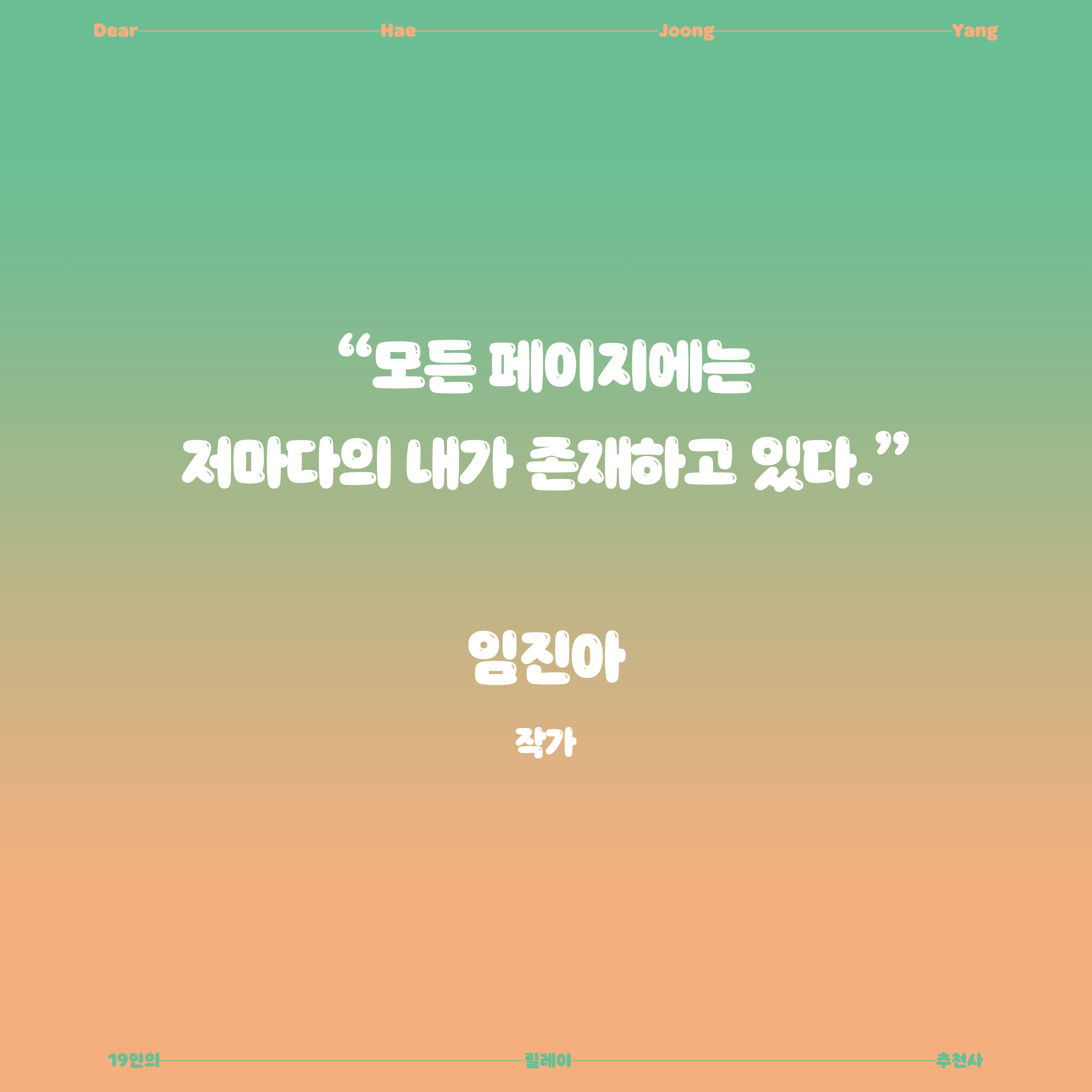
양해중뿐만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언제나 양해를 구하는 양해중 씨의 19가지 그림자』라는 제목의 뜻 말이다. 나뿐만이 아니라는 고백이고, 너뿐만이 아니라는 이해였다. 모든 페이지에는 저마다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 크고 작게 등장하는 나를 읽어나갈 때면 내 눈동자는 신속히 변했다. 어째 익숙한 눈이었다. 찡그리진 않지만 눈에 한가득 힘을 주게 되는 이 표정. 가만, 이건 내가 오줌 쌀 때의 눈이다.
언젠가 나는 집 화장실에서 참고 참았던 오줌을 싸면서 이런 문장을 떠올린 적이 있다. ‘아아. 마렵던 오줌을 싸는 행복.’ 오줌 싸는 걸 얼마나 좋아하면 한 문장에 오줌과 행복을 함께 놓았을까. 하지만 나는 사실 오줌 싸는 걸 싫어한다. 밖에서는 웬만하면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 바깥에서의 오줌은 왜 그리도 눈치 없이 길기만 한지. 하염없는 오줌 줄기를 탓하며 문 사이를, 천장을, 구멍을 바라보던 내 눈.
내가 나이기만 했던 아주 어린 시절 집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만난 검은 기운은, 평생 동안 마주하게 될 화장실마다 고개를 내밀고 있다. 없던 창문을 만들면서까지 두려운 장면을 앞서 상상해버린다. 오줌이 마렵다는 원초적인 본능을 앞서는 공포. 그게 평생 따라다닌다. 없더라도 있는 것, 있었기에 계속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나 그리고 우리의 삶이다. 이 책에는 그 네모칸에서의 도망이, 그리고 또다시 마주할 네모칸에서의 공포가, 아무도 모르는 나의 네모 안에서 들끓던 분노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집과 작업실 화장실에서만 비로소 요의를 온전히 해소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여전히 나의 시선은 창문에 가 있다. 옷을 추켜올리는 순간까지도 지켜야 하는 나의 안전. 책 속의 그림자들이 끝날 때마다 나는 화장실 창문에 둔 눈을 그제야 돌리듯 책을 닫았다. 오직 오늘만의 일일까. 이게 나만의 표정일까. 오늘의 아무 일 없음이 내일을 보장하진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같은 눈동자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분명한 어둠을 알고서 확실한 빛을 함께 가리키고 싶다. 이 책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심했어’가 없는 공감과 연대다. 당신이 드나들게 될 모든 네모칸을 우리 모두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이 책은 기꺼이 사실에 근거하여 외치고 있다.
